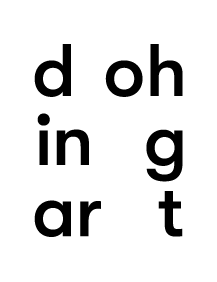도잉아트는 올해 2025년 12월 16일부터 내년 2026년 1월 24일까지 강주형, 김시종, 문은채, 임지민, Hirotoshi Iwasaki 다섯 작가가 참여하는 그룹전 《Click, Draw, Signals》을 개최한다.
이미지는 더 이상 하나의 장면에 머물지 않는다. 생성과 복제, 편집과 재조합의 속도는 인간의 감각을 앞지르며, 한 번 포착된 장면을 무수한 변형을 거쳐 전혀 다른 장면으로 전환한다. 이때 매체가 지닌 고유한 특성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이미지는 그 경계를 가로지르며 서로 다른 시간과 현실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다. 데이비드 조슬릿(David Joselit)이 『예술 이후』에서 지적했듯, 이미지는 “다양한 속도로 복제되고 재매개(remediation)되고 전파되는 능력”을 획득했고, “거의 무한하게 재매개되기 쉬운 시각적 바이트(byte)”로 작동한다. 이러한 동시대 시각 환경 속에서 이미지는 연결과 해제의 과정을 반복하며, 기술적 흐름 속에서 감각의 체계를 재구성한다. 그 흔들린 감각의 틈에서 우리는 이미지의 포화와 과잉이 남긴 균열과 마주한다.
이미지가 끝없이 가속되는 오늘의 시각 환경에서 이러한 변화는 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맞물리며 더욱 가속화된다. 기술은 이미지를 무한히 생성하고 배포하며 실시간으로 전환하는 기반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감각은 빠르게 휘발된다. 나아가 기술적 화려함은 감각의 깊이를 손쉽게 대체하며, ‘미디어아트’는 시각적 스펙터클의 장으로 축소될 위험에 놓여있다. 그렇게 멈춰 바라보고, 머무르고, 기억하는 시간은 사라지고, 이미지는 끝없이 흘러가며 감각의 표면만을 스치고 지나간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 시연의 표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이후의 감각’, 다시 말해 정서의 연결을 사유하는 일이다. 예술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이미지를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 사건으로 작동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지는 멈추고 흔들리고 다시 이어지는 미세한 순간 속에서 감각적 사건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바로 그때 감각의 구조가 재배치되고 사유의 리듬이 다시 만들어진다.
《Click, Draw, Signals》는 이미지가 움직이고 멈추는 방식에 관하여, 이미지가 순간을 촉발하는 누름(click), 시간의 흔적을 남기는 그리기(draw), 그리고 감각의 진동으로 전달되는 신호(signals)로 작동하는 방식을 들여다본다. 회화, 사진, 영상, 무빙 이미지, 애니메이션은 서로 다른 형식을 취하지만, 이 작업들은 하나의 질문을 공유한다. 이미지는 어떻게 감각을 조직하고 사고의 방향을 구성하며, 정서의 층위를 흔들어 관람자의 경험 속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장면의 움직임과 멈춤 사이, 시간의 간극에서 발생하는 감각의 진동이 예술의 시작이라면, 우리는 그 미세한 떨림 속에서 자신과 세계를 다시 바라보게 된다. 이러한 질문은 이번 전시에 참여한 다섯 명의 작가가 서로 다른 매체의 경계 위를 오가며 시도해 온 실천과 맞닿는다. 매체의 차이는 경계를 나누는 일이 아니라 감각이 움직이는 서로 다른 속도와 깊이를 드러내며, 그 차이는 곧 예술이 사유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
김시종은 ‘회화적인 사진’이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서 작업을 시작한다. 작가는 조선시대 민화나 17세기 네덜란드 정물화가 지닌 상징적 구성을 오늘의 시각 환경으로 옮겨오며, 그러한 이미지의 모티프를 사진이라는 매체 안에서 다시 구축해 왔다. 단일한 장면을 기록하는 사진의 관습적 방식을 넘어서기 위해 여러 요소를 콜라주하고 서로 다른 시간의 층위를 조합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화면은 기술적 정밀함에 기반하지만, 사진이 회화의 속성과 맞닿을 수 있는 감각적 결을 드러내며 손의 텍스처를 연상시키는 조형적 밀도를 획득한다. 김시종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삶과 죽음, 소멸과 기억을 사유하게 하는 바니타스적 메시지를 동시대의 감각 속에서 다시 호출한다. 소비되고 사라지는 이미지의 과잉 속에서 그는 현대인의 감각에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라는 오래된 질문을 되묻고,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놓치는지, 그리고 그 여운이 어디에 남는지를 사유하게 한다.
강주형은 이미지의 생성이 과도하게 가속되는 시대에 회화가 어떤 존재론적 자리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작가는 디지털 애니메이션 기법과 회화적 터치의 결을 결합해 ‘시간-회화’라는 개념을 탐구하며, 움직임과 회화 사이의 경계를 들여다보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일반적인 애니메이션이 장면과 장면을 매끄럽게 연결하고 현실적인 동작을 재현하는 방식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 강주형은 의도적으로 프레임의 단절과 거친 연결을 선택한다. 이 단절은 정지된 화면 내부에 잠재된 시간의 진동을 드러내고, 움직임의 조각들이 모여 감각적 시간의 흐름을 환기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의 작업에서 움직임은 서사의 전개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현실과 비현실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고 그 사이에서 촉발되는 감정의 미세한 떨림을 포착하는 감각적 장치다. 작가에게 회화는 고정된 이미지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변형되고 연장되는 ‘운동의 장’이며, 이 지점에서 디지털 기술은 묘사의 도구가 아니라 사유의 장치로 전환된다. 관람자는 그 진동 속에서 시간의 밀도와 감각의 속도를 감지하며, 이미지가 만들어내는 내면적 시간을 다시 경험한다.
문은채는 일상 속 찰나의 장면에서 출발하여 현실과 환상, 실제와 가상 사이의 미세한 간극을 탐색한다. 주변의 풍경이 자신으로부터 잠시 유리되는 순간을 포착하며, 감각되지 못한 채 사라져가는 정서의 흔적 속에서 멜랑콜리와 숭고의 감정을 끌어올린다. 변화와 정지, 예감과 고요가 공존하는 그 경계의 순간은 단순한 시각적 재현이 아니라 감정의 잠재적 진동을 건드리는 시간적 사건으로 다가온다. 작가는 회화의 화면을 ‘감각의 냉장고’로 비유하며 휘발되는 감정을 응축하여 고정하는 방식을 실험해 왔고, 이러한 탐구는 애니메이션이라는 시간 기반의 디지털 매체로 확장된다. 정지된 이미지가 움직임을 획득하는 순간, 감정은 화면을 통해 전파되는 데이터가 아니라 관객의 감각에 체험적으로 발생하는 장면으로 전환된다.
임지민은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보편적인 감정의 층위를 탐색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작가는 자신과 연관된 이미지들, 혹은 우연히 눈길을 사로잡은 장면들을 수집하고, 그로부터 파생된 이미지들을 겹쳐 놓음으로써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복합적인 감정의 총체를 회화적으로 구축한다. 이 과정에서 원래 이미지가 지녔던 문맥은 종종 사라지거나 숨겨지고, 투박한 손의 흔적이 남은 화면은 정교한 묘사 대신 정서적 울림을 강조하며, 하나의 ‘상징적 시(詩)’와 같은 형식으로 자리한다. 2019년부터 지속해 온 목탄 드로잉 애니메이션 작업은 회화만으로 담아내기 어려웠던 내밀한 이야기를 시간의 흐름 속에서 풀어내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손으로 그린 드로잉을 한 장씩 연결하여 구성된 영상은 반복된 선과 작은 떨림을 남기며 손 글씨 편지를 떠올리게 한다. 디지털 화면으로 재생되는 순간에도 사유의 흔적과 손의 온기는 지워지지 않는다. 이미지가 무한히 생성되고 소비되는 환경 속에서 작가의 작업은 손의 속도와 감정의 시간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히로토시 이와사키는 연필 드로잉 기반의 애니메이션 작업을 통해 정지와 움직임 사이의 경계를 탐색한다. 작가는 실사 영상을 한 프레임씩 추적하여 애니메이션으로 재구성하는 로토스코핑 기법을 사용하며, 애초에 애니메이터의 드로잉을 보조하기 위해 고안된 이 기술을 이미지의 기원을 탐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실사 장면 위에 직접 선을 따라 그리는 반복된 손의 노동은 축적된 선의 물성을 형성하고, 이러한 물성이 디지털 화면의 표면을 지지하며 기술이 감각을 드러내는 통로로 기능한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로토스코핑 과정에 콜라주 방식을 더해 서로 다른 움직임의 조각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연적으로 충돌하도록 배열하는 작업을 선보인다. 작가가 ‘움직임의 이탈(displacement of motion)’이라 개념화한 방식은 원래의 맥락에서 분리된 동작들을 통해 새로운 시적 운동의 형식을 생성하며, 기술에 가려졌던 감각의 표면을 서서히 드러낸다.